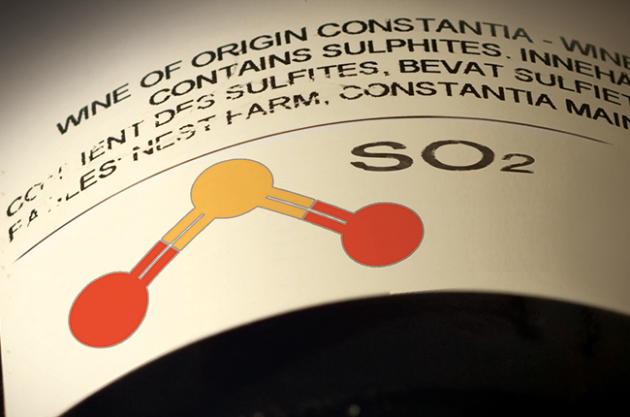막걸리와 파전 사이로 바라보는 썸.남.썸.녀!
파전과 막걸리. 최강의 궁합이라 일컫는 안주와 술 중 하나이다. 누가 파전을 막걸리와 같이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처음 했을까?
막걸리의 달달하며 살짝 텁텁한 맛은 파전의 기름지고 느끼한 맛과 어우러져, 입안에서 아밀라아제와 만나 당분을 형성한다. 목을 통해 넘어간 그 물질들이 술기운을 뿜어내면 젓가락의 행진이 이어진다. 어느새 정신 차리고 보면 파전은 다 없어져 있기 일쑤이다.

바삭바삭하고 기름진 파전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음식이다. 또한 외국 친구에게 한국 음식을 소개할 때 별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는 음식이기도 하다. 물론 그 미끄러운 감촉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긴 하다. 하지만, 한국식 피자라고 대충 소개하면 대부분 신기해하며 맛있게 먹는다. 피자와는 전혀 다른 제조 방법을 거쳐 만들어지지만 고소하고 기름진 맛은 세계 통용의 맛이 아니던가. 외국 친구가 ‘맛있다’라는 감탄사를 내뿜고 어깨를 들썩이는 동안 한 마디라도 더 설명해 줄 것이 필요하다. 파전의 유래는 어떨까.

동래파전 / 출처 : 한국관광공사
정확한 문헌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파전은 임진왜란 때 생겼다고 한다. ‘동래파전’이라는 그 고유 대명사가 생긴 건 이때이다.
1592년 부산진이 무너지고 왜군이 동래성으로 쳐들어 왔다. 3천 명에 불과한 동래성의 사람은 왜군을 막기에 턱없이 부족했다. 마름쇠와 건물 기와까지 동원해 왜군을 막았지만 무기도 결국 다 떨어지고 말았다. 최후의 수단으로 파를 화학무기처럼 이용했다고 한다.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래성은 왜군에게 함락되고 말았다.
하지만 그 후 그 동래에서는 동래부사 송상헌을 비롯한 동래 사람들을 기리기 위해 파를 넣어 부침개를 해먹었고 이것을 임금님께 진상하게 되면서 널리 퍼졌다고 한다. 일반인들이 파전을 즐기게 된 것은 1930년대 동래 동문 쪽에 <진주관>이라는 요정집이 문을 열면서부터이다. 고급유흥가로 이름을 떨치던 이곳의 기생들 덕분에 지금 우리도 파전을 즐기게 되었다.

파전에 빠질 수 없는 막걸리는 세계적인 알코올이 되어야 마땅하다. 62억 인구 모두에게 맞는 술이 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외국인에게 소개해서 실패한 경우는 없었다. 막걸리 특유의 톡 쏘는 맛과 달달한 맛이 놀라운 모양이다.
막걸리는 우리나라 술 중 가장 역사가 긴 술이다. 농경민족인 우리에게 가장 잘 맞는 술이다. 삼국사기에서부터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는 막걸리는 고려 시대, 배꽃이 필 때 만든다고 하여 이화주라는 이름을 가졌었다. 그 후로도 막걸리는 특유의 청량감으로 농사일하던 농부들의 갈증을 해소하는 데 널리 이용되었다. 예전 생활상을 다룬 소설을 보면 모두 새참으로 막걸리를 마시는 모습이 나온다.
목이 타들어 갈 정도로 땀을 흘리며 일을 하다 누군가가 시원한 주전자에 담아오는 막걸리. 찰랑거리는 소리를 들을 때부터 가슴이 두근거린다. 뽀얀 색깔을 드러내며 사발에 담아져 나오는 막걸리를 한 사발 마시면 몸 안쪽까지 얼음을 넣어놓은 듯 시원함을 느낄 수 있다. 대학생활 때 과에서 자주 가는 농촌활동을 한 번이라도 가본 사람은 그 느낌을 알 것이다. 물보다도 쉽게, 빠르게 넘어가는 그 달고 차가운 술.
막걸리는 한 병 사 들고 가서 혼자 먹으면 제대로 된 맛이 나지 않는다. 아직까지 막걸리를 혼자 마실 수 있는 펍이 있다는 소리는 듣지 못했다. 어떤 술이든 친밀감을 나누는 사람과 같이 먹을 때 제대로 된 화학작용을 일으킨다. 그중 막걸리는 시시껄렁한 이야기를 나누며 먹기에 제격이다.
누구나 쉽게 즐기고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막걸리와 파전. 비가 오는 축축한 날이면 가까운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파전 먹을래?’ 라고 묻는다. 그 가까운 사람과 함께 막걸리집 문을 열고 들어가 주문을 한다. 마시거나 먹다가 조금 흘리는 모습을 보여도 흉허물이 없을 만한 그런 사람들. 알딸딸하게 취해 문을 열고 나와 다음 만남을 기약하며 휘청거리는 발걸음으로 집을 향한다.

출처 : food.chosun.com
하지만, 혹시 연인이 되기 전 썸남 혹은 썸녀와 함께 파전에 막걸리를 곁들인 적이 있는가? 아직 서로에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막걸리는 무리수 아니냐고 항변할 수도 있다. 특유의 냄새를 풍기는 막걸리는 입에 들어가면 더욱 강한 향을 내고, 기름진 파전은 젓가락으로 집다 떨어트리기 일쑤이다. 게다가 파전을 먹다 파가 이 사이에 끼기라도 하면 … 아직 서로를 알아가는 시기에 나쁜 인상을 남길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막걸리병 사이로 보이는 썸남의 눈길은 평소보다 그윽하다. 막걸리집 특유의 붉은 기를 내뿜는 조명 아래 그 사람의 숨결은 더 가까이 느껴진다. 막걸리 냄새 사이로 들리는 주위 사람들의 대화는 단출하게 느껴지며 둘의 대화를 더욱 진솔하게 만든다. 소주병이나 맥주병이 아닌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막걸리병은 사람을 둥글게 만들고 이 밤의 모든 것을 포용하게 만들어 준다.
거기에 비까지 곁들어 안주로 삼는다면 금상첨화이다.
빗방울이 창문에 튕기며 내는 반복적인 리듬은 기름의 하모니를 연상시켜 술을 부른다. 사실 빗소리와 기름 튀기는 소리가 비슷하다는 것에 동의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런 문구가 널리 퍼지며 주류 업계가 받은 시너지 효과는 어마어마하다.
꼭 그런 연상 작용이 아니더라도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밤은 사람을 감성적으로 만든다. 조그마한 감정의 박동에도 쉽게 반응하며 슬쩍 스침에도 전율한다. 이런 날이야 말로 썸을 타는 그 사람과 만나기에 최적이다.
당장 전화기를 들어 메시지를 보내보라.
거창한 시구 같은 건 곁들이면 역효과이다. 담담한 어투로 막걸리에 대한 유혹을 보내라. 빗소리에 적응된 그 사람이라면 바로 확답을 보낼 것이다.
You Might also Like